살색의 감독 무라나시
저번 달인가. 늦은 밤 연인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와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연인과 거의 합의하에 서로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연애에 대한 의욕 또한 바닥에 가까운 상태. 달래거나 혼내도 별 의욕이 없던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최근 자기가 살아가야할 이유를 찾았다며 나에게 꼭 보라고 한 드라마가 있었다. 꼭 혼자 있을때만 봐야한다고 속삭이는 것은 덤.

그렇게 해서 보게 된 드라마가 '살색의 감독 무라나시'였다. 짧은 소개를 읽어보니 일단 심상치가 않다. 황금기 시절 일본의 AV 산업 현장에 대한 드라마라니. 안 볼수가 없잖아.
AV를 보는 시선
빌드업을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AV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어릴 적 기억으로는 가끔 엄마와 함께 갔던 비디오 대여점 한 구석에 있는 헐벗은 여성분들이 기억난다. 뭔가 보고만 있어도 죄를 짓는 기분이여서 엄마 몰래 힐끗 힐끗 처다보는게 전부였다.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다.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라왔던 나로써는 뭔가 성인물을 보는 것은 죄악에 가까운, 아니 순수 죄악 그 자체로 느껴졌을지도. 아마 그 당시 보건교육 수준으로는 내 또래 대부분이 당연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은 어떨까. 혹시나 싶어 여러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요즘 자료를 찾아봤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그러니깐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씨뻘건 키컬러, stop signal 등을 통해 '음란물=보면 안되는 것'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는듯 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데이터. 과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저런 설문을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진실을 말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였던 15년 전에도 데이터는 과반수가 나왔을텐데.
뭐 여튼간 AV를 보는 시선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당장 나 또한 그런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드라마를 다 보는데까지 (정확하게는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1달이 넘게 걸렸다.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여겨지게 되는 AV. 이 드라마는 그런 부끄러움을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남에게 보여준다는 것

주인공인 감독 무라니시는 원래 찐따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실적이 제로인 세일즈맨이자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버림받는 인물. 그런 인물이 우연한 기회에 '으른의 세상'에 발을 담구게 된다. 기존의 판매만을 위한 보여주기용 AV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담겨있는 AV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 '진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겸, 유학비를 벌 겸, 감독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온 카오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며 제모하지 않은 겨드랑이를 토크쇼에서 보여주는 등, 이 드라마에서 겉과 속이 투명한, 그야말로 존재 그대로의 나로써 살아가는 인물이다.
두 인물의 핑퐁을 통해서 드라마는 시종일관 본능으로써의 자아와 사회적 인물로써의 자아간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토크쇼 진행자의 질문에 '당신은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솔직해본적이 있습니까?'라며 물어보는 무라니시. 너와 우리를 위해 내 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능, 욕망에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것, 인간스러운 것이라고.

올해 초 멀티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트랜디한 단어라고 떠오른 적이 있었다. SNS, Vlog 등을 통해 내 안에 또다른 캐릭터, 부캐를 만드는 것이 대세가 된 현상을 설명하며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다원적으로 바뀌지만 자기 고유의 정체성은 매우 불안정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가족 안에서의 내 모습과 다르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있을때와 동호회 사람들 사이의 내 모습이 다르다. 엄마가 나를 떠올릴 때의 모습과 직장 동료가 나를 떠올릴 때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면,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일까.
꿈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라니시. 기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고있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AV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하와이로 해외촬영을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아 운칠기삼이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감독으로써의 그의 실력은 '잘 모르겠네...?' 수준으로 비춰지지만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뮤즈를 만난다는, 소위 운빨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무라니시는 좀 달랐다. 아이가 둘 있는 이혼남이면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AV 거장이 되겠다는 꿈을 굽히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 걸리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것 처럼 가족을 떠나 외인으로 살아간다. 돈과 명예가 주여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이쯤되면 그 운빨조차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그가 처음으로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업을 접었더라면,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운빨이 그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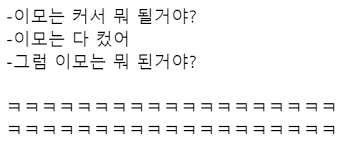
우리도 다 컸다고 생각한다. 낼 모레 서른이라며, 꿈을 꾸기에는 늦은 것이 아니냐며 그냥 지금 있는 곳이 거지같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둔다. 요즘 친구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연애, 내집장만, 노후보장 셋 중 하나에 수렴한다. 마치 ABO형으로 전 인류를 나누듯 90년대생의 타입이 저 셋만 존재하는 듯 보인다.

우리 또래에게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을 물어본다면 누구나 꼬북이, 파이리, 이상해씨를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본다면 1세대 스타팅에는 피카츄도 들어있다. 모두가 물불풀을 고를 때, 우리가 가슴뛰면서 보았던 피카츄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웅이의 롱스톤조차 이기지 못하면 뭐 어떤가. 체육관 관장을 아무리 이기는 것보다 그냥 피카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더 멋지지 않을까.
'home sweet home > movie, dram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짱구는 못말려 어른 제국의 역습 : 노스탤지어를 받아들이는 어른 (0) | 2020.12.27 |
|---|---|
| 블러드 샷 :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0) | 2020.11.29 |
| 디지몬 어드벤처 라스트 에볼루션 인연 : 사람 울리게 하는거 아니다ㅠㅠ (0) | 2020.10.06 |
| 보건교사 안은영 : B급 감성의 메이저화 (0) | 2020.10.04 |
| 파닥파닥 : 횟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0) | 2020.09.12 |



